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

- 저자 :박영화
- 출판사 :행성B
- 출판년 :2019-11-14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4-05-23)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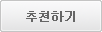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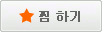
“법의 여신 디케는 과연 냉철하고 정의롭기만 할까?”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가장 정의롭다고 믿어온 사법계에 많은 이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법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고민해보았을까.
사람 냄새나는 법을 위해 애쓰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엘리트주의와 심지어 ‘쉬우면 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법조계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의 체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만약 누군가 법이 권위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실제 법정은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과
얼마나 닮았을까
대다수의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을 통해 재판을 경험하지 않을까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논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려 열띠게 변론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멋지게 그려진다.
하지만 꼭 그럴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들려준다. 법복은 왜 까만색이며, 우리나라의 디케상은 왜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지,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구두 변론을 하는지부터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는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판사는 과연 국가의 편인지 등, 법과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낸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보아온 저자의 경험담은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두 직업을 모두 체험했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이 책에 생생하게 녹여냈다. 법대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판사와 변호사의 서로 다른 세계를 견주어보는 재미도 있다.
‘법대로 합시다’를 외치기 전에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묻다
이 책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깃거리가 많이 담겨 있다. 흔히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저자는 무분별한 소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하기를 조언한다. 판사 시절 연간 150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고, 변호사가 된 뒤엔 때때로 수임을 마다하면서까지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는 소송했을 때 가족과 이웃 사이에 얼굴을 붉히거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이 판사나 변호사의 또 다른 임무라고 말한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부부의 이혼처럼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소송도 적지 않다. 이때 법의 칼을 잘못 들이댔다간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길 뿐, 상흔도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다.
이 책은 가해자라면 무조건 처벌받는지,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의 미묘한 사안이 법이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는다. 우리의 예상과는 제법 다를 수 있는 책 속 여러 판결을 살피다 보면, 과연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다시금 생각하고 법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야 하기에, 법의 최전방에서 일하면서도 저자에게 법은 가장 마지막에 내밀어야 하는 최후의 카드였다. 그 바탕엔 사회 정의와 개인의 평온한 삶을 동시에 지키려 한 저자의 고민이 깔려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법과 정의의 온도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을 내려야 했던 판사는 가해자라고 해서 모두 엄벌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작은 선물이나 부조금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조인이 품은 고민과 애환의 흔적을 좇다 보면 선과 악의 경계, 법과 정의의 실현이 그리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진정한 정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책 속에 펼쳐지는 법과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한 법’이란 무엇인지, 그동안 법의 엄정함을 냉정함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도 사람이며, 그들이 지켜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누군가도 결국 사람이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 즉 인정이 작용할 수 있는 ‘인간적 영역’을 저자가 되짚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선량함을 믿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베테랑 법조인이 법정에서 깨달은 것들
‘정의란 무엇인가’는 언제나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구는 화두다. 최근 사법농단 등으로 인해 가장 정의롭다고 믿어온 사법계에 많은 이가 실망을 감추지 못했고, 법적 판단의 공정성에도 의문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우리는 정작 법과 진정한 정의에 대해 얼마나 많이, 또 깊이 알고 고민해보았을까.
사람 냄새나는 법을 위해 애쓰는
어느 법조인의 고백
《법에도 심장이 있다면》은 16년을 판사로, 16년을 변호사로 살아온 저자가 법정에서 만난 사람과 사건을 중심으로 진정한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책이다. 이 책을 읽다 보면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펼쳐지는 또 다른 세상을 생생히 마주하게 된다. 그 과정을 통해 우리는 그동안 잘 몰랐거나 오해한 법의 진면목을 살펴볼 수 있다. 법조인임에도 불구하고 저자는 꼭 필요할 때만 법을 선택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무엇보다 저자는 엘리트주의와 심지어 ‘쉬우면 법이 아니다’라는 식의 인식이 만연해 있는 법조계에서, 시민에게 다가가는 법의 체온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다. 만약 누군가 법이 권위적이고 우리와 동떨어진 것으로만 여겼다면, 이 책이 그런 생각을 바꿀 계기를 마련해줄 것이다.
실제 법정은 영화나 드라마 속 법정과
얼마나 닮았을까
대다수의 사람은 영화나 드라마 속에 등장하는 재판 장면을 통해 재판을 경험하지 않을까 한다.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논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와, 억울하게 누명을 쓴 의뢰인의 무죄를 밝히려 열띠게 변론하는 변호사의 모습은 꽤 멋지게 그려진다.
하지만 꼭 그럴까.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판사와 변호사의 실제 삶과 법정에서 벌어지는 온갖 사건을 들려준다. 법복은 왜 까만색이며, 우리나라의 디케상은 왜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는지, 변호사는 영화나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멋지게 구두 변론을 하는지부터 배석판사는 재판장의 지시를 받는지, 형사소송과 행정소송에서 판사는 과연 국가의 편인지 등, 법과 관련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해와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낸다. 30년 넘게 법정에서 울고 웃는 사람들을 보아온 저자의 경험담은 때로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한 편의 법정 드라마라고 할 수 있다.
저자는 판사와 변호사로 일하면서 이 두 직업을 모두 체험했고, 그 경험과 깨달음을 이 책에 생생하게 녹여냈다. 법대를 사이에 두고 펼쳐지는 판사와 변호사의 서로 다른 세계를 견주어보는 재미도 있다.
‘법대로 합시다’를 외치기 전에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묻다
이 책엔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거나 소송 중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이야깃거리가 많이 담겨 있다. 흔히 분쟁이 생겼을 때 법이 만병통치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저자는 무분별한 소송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며 심사숙고하기를 조언한다. 판사 시절 연간 150건에 이르는 민사사건을 조정으로 마무리 짓기도 했고, 변호사가 된 뒤엔 때때로 수임을 마다하면서까지 당사자들에게 화해를 권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저자는 소송했을 때 가족과 이웃 사이에 얼굴을 붉히거나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도록 중재하는 것이 판사나 변호사의 또 다른 임무라고 말한다. 특히 친족 간의 재산 분쟁이나 부부의 이혼처럼 가까운 사이에 일어나 그만큼 감정의 골이 깊을 수밖에 없는 소송도 적지 않다. 이때 법의 칼을 잘못 들이댔다간 서로의 가슴에 상처만 남길 뿐, 상흔도 훨씬 더 크기 마련이다.
이 책은 가해자라면 무조건 처벌받는지, 원래 땅 주인이라고 해서 언제나 자기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등의 미묘한 사안이 법이면 해결되는지에 대해서도 답을 내놓는다. 우리의 예상과는 제법 다를 수 있는 책 속 여러 판결을 살피다 보면, 과연 소송만이 정답일까를 다시금 생각하고 법을 더욱 잘 이해하는 기회가 될 것이다.
법은 ‘최선’이 아니라 ‘차선’이 되어야 하기에, 법의 최전방에서 일하면서도 저자에게 법은 가장 마지막에 내밀어야 하는 최후의 카드였다. 그 바탕엔 사회 정의와 개인의 평온한 삶을 동시에 지키려 한 저자의 고민이 깔려 있다.
차갑고 날카로운 법을 넘어서는
진정한 법과 정의의 온도
헤아릴 수 있는 모든 사정을 참작해 판결을 내려야 했던 판사는 가해자라고 해서 모두 엄벌할 수 없었고, 피고인에게도 작은 선물이나 부조금을 보내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법으로 세상과 소통하는 법조인이 품은 고민과 애환의 흔적을 좇다 보면 선과 악의 경계, 법과 정의의 실현이 그리 단순치 않음을 알 수 있다.
이 책은 진정한 정의와 법조인의 역할에 대해 끊임없이 묻는다. 책 속에 펼쳐지는 법과 사람의 면면을 살펴보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사는 사람’과 ‘사람을 위한 법’이란 무엇인지, 그동안 법의 엄정함을 냉정함과 같은 것으로 치부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법을 다루는 판사와 변호사도 사람이며, 그들이 지켜내고 벌을 주어야 하는 누군가도 결국 사람이다. 판사에게 주어진 재량, 즉 인정이 작용할 수 있는 ‘인간적 영역’을 저자가 되짚는 것도 사람들의 마음 한구석에 자리한 선량함을 믿으려는 의지에서 비롯되었음을 이 책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