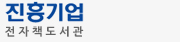우리 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1
우리 산하에 인문학을 입히다 1

- 저자 :홍인희
- 출판사 :교보문고
- 출판년 :2022-01-01
- 공급사 :(주)북큐브네트웍스 (2024-05-23)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스마트기기
- 듣기기능(TTS)지원(모바일에서만 이용 가능)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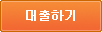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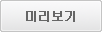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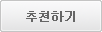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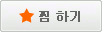
뭐니뭐니해도 대관령 이야기의 압권은 조선 중종 때의 명신 고형산과 관련된 일이다. 실록 등 각종 사료에 따르면, 그는 당시 한양에서 벼슬을 하던 중 횡성에 살고 있는 노모가 병환에 시달리자 사직을 청한다. 이에 그를 아낀 임금은 강원도 관찰사로 임명해 어머니를 보살피면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배려한다. 관찰사로서 각 지역을 순방하다가 대관령 길이 두 명이 메는 2인교 가마 하나가 간신히 지나다닐 정도로 좁은 것을 보고 사재까지 털어가며 수개월 만에 이를 4인교 가마가 통과할 만큼 넓힌다. 지금으로 치자면, 2차선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한 셈이다. 조정으로부터 선정善政을 펼친 목민관으로 칭송받던 그는 이후로도 호조ㆍ형조ㆍ병조판서와 우찬성 등 고위직을 두루 거치고 76세를 일기로 사망한다.
그가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조선 강토가 청나라 군사들의 말발굽 아래 놓이게 되고 ‘삼전도 굴욕’이라는 인조의 치욕스러운 항복이 있고 나서야 전란은 마무리된다. 이때 지하에 묻혀 있던 고형산에게는 예기치 않은 불운이 닥친다. 1940년판 《강원도지》에 따르면 ‘호란이 발발한 초기, 주문진으로 상륙한 청나라 군대가 대관령을 쉽사리 넘었기 때문에 한양을 조기에 장악할 수 있었다며, 결국 이 길을 편리하게 닦아놓은 고형산에게 책임이 돌아갔다’고 적고 있다. ‘도로 확장죄’라고나 할까? 어쨌건 분노한 임금의 명에 의해 횡성에 있던 그의 묘가 졸지에 파헤쳐지는 수난을 당했다. 다행히 그의 공적은 나중에 재평가되고 복권되어 그에게 ‘위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횡성 고씨 후손에게는 고향 마을 사방 10리 땅이 하사되었다고 한다.
- p.21~22
강원도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표현은 대체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암하노불岩下老佛’ 또는 ‘암하고불岩下古佛’이다.
암하노불은 암하고불이 의도적으로 변질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말기 불교에서 종래의 교종을 대신해 선종이 득세하게 되면서 이른바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일어나 범일국사 등 저명한 선승들이 강원도 일대 사찰로 모여들어 수도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고려 말까지는 강원도 사람들을 선승들에 빗대 ‘암하고불岩下高佛’, 즉 ‘바위 아래 있는 덕이 높은 부처’라는 뜻으로 불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유학자들이 “부처의 시대는 물 건너갔다”며 암하고불岩下古佛 또는 암하노불岩下老佛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승병을 일으키는가 하면, 일제 강점기에는 만해선사한용운가 설악산 백담사에서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을 짓고, 한암선사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도하며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는 등 암하고불岩下高佛의 전통은 계속되었다.
- p.117
태봉국 궁예가 죽은 후 37년이 지나 또 한 명의 지존이 자신의 어머니 죽방왕후와 처자, 충신열사들을 이끌고 경주, 충주, 제천, 양평을 거쳐 강원도 깊은 산으로 찾아든다. 그가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이다. 《삼국사기》는 당시 상황을 ‘이에 경순왕이 시랑 김봉휴로 하여금 국서를 가지고 가서 태조고려에게 귀부를 청하게 했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을 이별하고 곧 개골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지해 집을 짓고 마의와 초식으로 일생을 마쳤다’며 담담하게 기술한다.
그러나 정사의 설명과 달리 오래전부터 마의태자가 당시 강원도로 와서 원주와 횡성 어답산, 홍천 지왕동 등을 지나 설악산 기슭 밑 인제군에서 ‘신라소국’을 세우고 대왕으로 옹립된 후 상당 기간 동안 고려에 대한 항전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그 일대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명, 유물, 유적 등 갖가지 증거가 수두룩하다. 우선 서울에서 속초 방향으로 가다 한계령을 넘기 전 나오는 인제군 상남면에는 김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김부’는 경순왕의 이름金傅과 음이 동일하다. 다만 이 지명은 경순왕이 아닌 그의 아들 마의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사》를 보면 ‘이곳은 과거 김부동, 김보왕촌, 김보왕동, 김보리를 거쳐 김부리가 되었는데,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이곳에 와 머무르며 신라를 재건하고자 김부대왕이라 칭하고 양병을 꾀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 지금도 김부대왕각이 있어 봄가을 동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 p.178~180
그가 죽은 지 100년이 훨씬 지난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난다. 조선 강토가 청나라 군사들의 말발굽 아래 놓이게 되고 ‘삼전도 굴욕’이라는 인조의 치욕스러운 항복이 있고 나서야 전란은 마무리된다. 이때 지하에 묻혀 있던 고형산에게는 예기치 않은 불운이 닥친다. 1940년판 《강원도지》에 따르면 ‘호란이 발발한 초기, 주문진으로 상륙한 청나라 군대가 대관령을 쉽사리 넘었기 때문에 한양을 조기에 장악할 수 있었다며, 결국 이 길을 편리하게 닦아놓은 고형산에게 책임이 돌아갔다’고 적고 있다. ‘도로 확장죄’라고나 할까? 어쨌건 분노한 임금의 명에 의해 횡성에 있던 그의 묘가 졸지에 파헤쳐지는 수난을 당했다. 다행히 그의 공적은 나중에 재평가되고 복권되어 그에게 ‘위열공’이라는 시호가 내려졌고, 횡성 고씨 후손에게는 고향 마을 사방 10리 땅이 하사되었다고 한다.
- p.21~22
강원도 사람들에 대한 평가와 표현은 대체로 일관성을 갖고 있다. 가장 많이 인용되는 것이 ‘암하노불岩下老佛’ 또는 ‘암하고불岩下古佛’이다.
암하노불은 암하고불이 의도적으로 변질된 것이다. 통일신라시대 말기 불교에서 종래의 교종을 대신해 선종이 득세하게 되면서 이른바 ‘구산선문九山禪門’이 일어나 범일국사 등 저명한 선승들이 강원도 일대 사찰로 모여들어 수도하게 된다. 이러한 연유로 고려 말까지는 강원도 사람들을 선승들에 빗대 ‘암하고불岩下高佛’, 즉 ‘바위 아래 있는 덕이 높은 부처’라는 뜻으로 불렀으나,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유교를 국교로 하면서 유학자들이 “부처의 시대는 물 건너갔다”며 암하고불岩下古佛 또는 암하노불岩下老佛로 격하시켰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사명대사가 금강산 유점사에서 승병을 일으키는가 하면, 일제 강점기에는 만해선사한용운가 설악산 백담사에서 그 유명한 〈님의 침묵〉을 짓고, 한암선사는 오대산 상원사에서 수도하며 일본의 패망을 예견하는 등 암하고불岩下高佛의 전통은 계속되었다.
- p.117
태봉국 궁예가 죽은 후 37년이 지나 또 한 명의 지존이 자신의 어머니 죽방왕후와 처자, 충신열사들을 이끌고 경주, 충주, 제천, 양평을 거쳐 강원도 깊은 산으로 찾아든다. 그가 신라의 마지막 태자 김일이다. 《삼국사기》는 당시 상황을 ‘이에 경순왕이 시랑 김봉휴로 하여금 국서를 가지고 가서 태조고려에게 귀부를 청하게 했다. 왕자는 통곡하며 왕을 이별하고 곧 개골산으로 들어가 바위에 의지해 집을 짓고 마의와 초식으로 일생을 마쳤다’며 담담하게 기술한다.
그러나 정사의 설명과 달리 오래전부터 마의태자가 당시 강원도로 와서 원주와 횡성 어답산, 홍천 지왕동 등을 지나 설악산 기슭 밑 인제군에서 ‘신라소국’을 세우고 대왕으로 옹립된 후 상당 기간 동안 고려에 대한 항전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는 주장이 있다. 실제로 그 일대에는 이를 뒷받침해주는 지명, 유물, 유적 등 갖가지 증거가 수두룩하다. 우선 서울에서 속초 방향으로 가다 한계령을 넘기 전 나오는 인제군 상남면에는 김부리라는 마을이 있는데 여기서, ‘김부’는 경순왕의 이름金傅과 음이 동일하다. 다만 이 지명은 경순왕이 아닌 그의 아들 마의태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제군사》를 보면 ‘이곳은 과거 김부동, 김보왕촌, 김보왕동, 김보리를 거쳐 김부리가 되었는데, 신라 56대 경순왕의 아들 마의태자가 이곳에 와 머무르며 신라를 재건하고자 김부대왕이라 칭하고 양병을 꾀했다고 해서 그렇게 불린다. 지금도 김부대왕각이 있어 봄가을 동제를 지내고 있다’고 한다.
- p.178~180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