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마
역마

- 저자 :김동리
- 출판사 :eBook21.com
- 출판년 :0000-00-00
- 공급사 :(주)북토피아 (2006-01-11)
- 대출 0/5 예약 0 누적대출 0 추천 0
- 지원단말기 :PC/전용단말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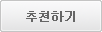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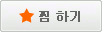
성기가 다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것은 이듬해 우수 경칩도 다 지나 청명 무렵의 비가 질금거릴 즈음이었다. 주막 앞에 늘어선 버들가지는 다시 실같이 푸르러지고, 살구, 복숭아, 진달래들이 골목 사이로 산기슭으로 울긋불긋 피고 지고 하는 날이었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나 보는드키 재줄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리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듸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에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아들의 미음상을 차려들고 들어온 옥화는 성기가 미음 그릇을 비우는 것을 보자, 이렇게 물었다.
'아직도 너, 강원도 쪽으로 가보고 싶냐?'
'‥‥‥'
성기는 조용히 고개를 돌렸다.
'여기서 장가들어 나랑 같이 살겠냐?'
'‥‥‥'
성기는 역시 고개를 돌렸다.
그 해 아직 봄이 오기 전, 보는 사람마다 성기의 회춘을 거의 다 단념하곤 하였을 때, 옥화는 이왕 죽고 말 것이라면, 어미의 맘속이나 알고 가라고 그래, 그 체장수 영감은, 서른여섯 해 전 남사당을 꾸며 와 이 <화개장터>에 하룻밤을 놀고 갔다는 자기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었다는 것과, 계연은 그 왼쪽 귓바퀴 위의 사마귀로 보아 자기의 동생임이 분명하더라는 것을, 통정하노라면서, 자기의 왼쪽 귓바퀴 위의 같은 검정 사마귀까지를 그에게 보여주었다.
'나도 처음부터 영감이 <서른여섯 해 전>이라고 했을 때 가슴이 섬뜩하긴 했다. 그렇지만 설마 했지, 그렇게 남의 간을 뒤집어놀 줄이야 알았나. 하도 아슬해서 이튿날 악양으로 가 명도까지 불러봤더니, 요것도 남의 속을 빤히 들여다나 보는드키 재줄대는구나, 차라리 망신을 했지.'
옥화는 잠깐 말을 그쳤다. 성기는 두 눈에 불을 켜듯한 형형한 광채를 띠고, 그 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고 있었다.
'차리리 몰랐으면 또 모르지만 한번 알고 나서야 인륜이 있는듸 어찌겠냐.' 그리고 부디 에미 야속타고나 생각지 말라고 옥화는 아들의 뼈만 남은 손을 눈물로 씻었다.
옥화의 이 마지막 하직같이 하는 통정 이야기에 의외로 성기는 도로 힘을 얻은 모양이었다. 그 불타는 듯한 형형한 두 눈으로 천장을 한참 바라보고 있던 성기는 무슨 새로운 결심이나 하듯 입술을 지그시 깨물고 있었다. 아버지를 찾아 강원도 쪽으로 가볼 생각도 없다, 집에서 장가들어 살림을 할 생각도 없다, 하는 아들에게 그러나, 옥화는 이제 전과 같이 고지식한 미련을 두는 것도 아니었다.
'그럼 어쩔라냐? 너 졸 대로 해라.'
'‥‥‥'
성기는 아무런 말도 없이 도로 자리에 드러누워 버렸다.
지원단말기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PC : Window 7 OS 이상
스마트기기 : IOS 8.0 이상, Android 4.1 이상
(play store 또는 app store를 통해 이용 가능)
전용단말기 : B-815, B-612만 지원 됩니다.
★찜 하기를 선택하면 ‘찜 한 도서’ 목록만 추려서 볼 수 있습니다.




